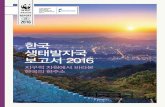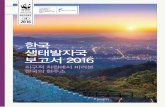제 2 회 국제선형충돌가속기 (ILC) Workshop 초전도 RF Cavity 의 기술 및 ILC 건설에 한국 의 참여방안, PAL 의 관련 연구소개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 제다 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Transcript of 한국 제다 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
한국 ‘제다’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
정 순 일*1)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및 한국예다학연구소장
The Transmissional Value of Korean Tea Manufacture a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eong, SunIl*
Professor of Won-Buddhist department of Wonkwang University and Director of Korea Tea & Tao Research Institute, Jeonbuk 54538, Korea
목 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제다의 역사와 그 지속성Ⅲ. 제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Ⅳ. 제다의 학문적⋅지역적⋅미래적 과제Ⅴ.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에서 제다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도록 그 전통이 남아있다. 제다는 그 과정 혹은 그 결과에서 내재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제다법과 사용 도구에 따라 외재화 된 아름다움이 형식미로 나타난다. 제다에 대한 제반 분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다현상과 제다 전승자, 그리고 제다 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분석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음식제조와 제다를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2016년, 문화재청에 의하여 제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차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다와 관련한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제다의 원형을 찾고 각종 제다방법에 대한 보호⋅전승이 필요하다. 둘째, 제다 기술을 보유한 전승자를 계승하게 하고, 소멸위기에 있는 전통 제다장비를 유형문화재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적절한 전승주체를 단위별 지역별로 선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제다인 전반에 포괄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진흥방법을 세워야 한다.
주제어: 무형문화재, 차문화, 제다, 차산업, 음식제조.
Abstract
Tea making has a long history in Korea. We can find not only the immanent beauty of the tea making process or product but also the external and formal beauty of tea making method and equipment. We assume that comprehensive data analysis and academic organization about tea making, transmitter, and tea making technique should be done on the tea making field. We suggest that the present study results will create synergy effects by connecting food manufacture and tea making. We expect that tea industry and culture will be vitalized based on the fact that it has been designated a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2016. We have the following projects on tea making. First, we need to find the original form of various Korean tea making methods, and protect and transmit them. Next, we need to protect the endangered traditional tea making equipment as tangible cultural assets, and to find a transmitter who is a master of the tea making process. Furthermore, we should select and support a proper transmitter in units and regions. Finally, we need to provide general support to tea maker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 Corresponding Author: Jeong, SunIl, E-mail: [email protected], Tel: 82-63-850-6124, Fax: 82-63-850-7303
주제논문 한국예다학 제3호 pp.1-14
-
2 ▪ 한국예다학 제3호(2016. 10)
Key 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 culture, tea making, tea industry, food manufacture
Ⅰ. 머리말
차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2016년 7월 14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라 하겠다. 그날 제다(製茶)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개정된 이래 아리랑(제129호)에 이어 제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1) 그것은 제다가 아리랑과 동등하게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다는 가치
와 위상을 인정받은 공식적인 기록이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
용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제다’의 보존․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 추진 등 ‘제다’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 이는 제다인을 비롯한 모든 차인, 그리고 무형문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긍지를 높이고, 향후 증폭된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경사라 할 만하다.
특히 이번의 일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차를 사랑하고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며 묵묵히 차를 만들어오고 전승해
온 제다인 모두와 차 연구가들의 노고에 보답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인들로서는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차를 더욱 발전시킬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순간으
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
(茶)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의미한다.3)
우리나라에서 차 관련 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다례의식」 분야에서였다. ‘궁중다례’와 ‘규방다례’가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4) 이들 다례는 유아 및 청소년의 인성
교육 함양과 연계하여 교육지표가 되고 있고, 우리의 오랜 차문화를 선양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차는 음료이지만 찻잎에서 음료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
을 포괄하는 제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제다’는 식료를 가공 처리하여 식품을 만드는 ‘음식제조’에 속하므로, 제다의 보존은 산업⋅문화적 측면뿐 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오늘날 차의 교역과 소비가 글로벌화하면서 전 세계적
으로 차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전통 제다문화는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한국적 문화’와 ‘한국적 먹을거리’의 기반이 되는 ‘한국적 제다’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보호⋅전승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되어 왔던 차이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러한 중요성에 착목하여 이미 무형문화재 지정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우리나라
에서 제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재삼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제다가 지니는 전승가치를 문화재 지정에 요
구되는 몇 가지 틀에 입각하여 살펴봄으로써 제다의 문화
재적 가치를 보편화하는 동시에, 그에 바탕을 두고 미래의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Ⅱ. 우리나라 제다의 역사와 그 지속성
1. 제다의 역사
1) 제다의 출현과 역사적 전개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는 일제강점기
아오키 마사루(靑木正兒)가 소장한, 고구려 고분에서 나온 직경 4cm 엽전모양의 소형 병차(餠茶)5)로 알려져 있다. 또한 차 시배지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興德
1)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그 특성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융성정책 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2015.7.14. 문화재청 보도자료)
2)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6년 7월 19일자.
3) 위의 글.
4) 궁중다례의식이 200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로, 규방다례가 200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5) 靑木正兒, 靑木正兒全集 第8卷, 春秋社, 東京, 1971, p.262. “나는 고구려 고분에서 나왔다고 하는, 소형의 얇은 병차를 표본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직경 4센티 남짓의 엽전형태로, 중량은 5푼 정도이다. (私は高句麗の古墳から出たと稱する、小形で薄片の餠茶を標本として藏してゐるが、直徑四センチ餘りの銭形で、重量五分ばかり有る)”
-
정 순 일 / 한국 ‘제다’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 ▪ 3
王)」(828)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지리산 일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차는 이미 7세기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661)에는 ‘병반다과(餠飯茶菓)를 준비하여 가야제사를 종묘에 합사하라’는 기록7)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의 역사는 훨씬 더 위로 소급될 여지도 있다.
한편 중국의 용단봉병(龍團鳳餠)이 고려에 전래된 사실에 관해서는 고려사(高麗史),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등에 나타나 있다.8) 또 고려도경 「다조(茶俎)」조에는 납차(臘茶)와 용봉단(龍鳳團)이 하사품 이외에 상품으로 유통 판매되었다는 기록도 있고,9) 토산차의 맛이 쓰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에 단
차 생산과 함께 점다법도 퍼져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조에 ‘전다(煎茶)’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 이미 끓여 마시는 음다법에 적합한 병차를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시대의 병차를 끓여마시던 전다법(煎茶法)이 고려시대 점다법으로 이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보다 정교해진 고형차인 단차(團茶)와 이 단차를 가는 차맷돌 다마(茶磨)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차맷돌은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등의 시제(詩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동
안 철연(鐵碾)이나 맷돌(磨)과 같은 차를 가루 내는 다구의 등장을 통해 보면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에 이르
는 동안 병차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왕실과 관련된 거국적 행사와 차문화의 관계를 살
펴보면 팔관회가 주목된다. 고려의 팔관회는 건국 초부터 말까지 지속된 국가적 불교행사였다. 행사시기는 매년 11월 15일 개경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그 한 달 전부터 서경에서는 나라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며 많은
이들이 그 의례에 참가하여 차를 마시는 행사에 참여하였
다.10) 이로 미루어 보아도 고려시대에 조야에 차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11)
또한 고려시대에 송과의 국교(國交)에서도 차는 중요 의례에 사용되고 있었다. “합문사가 ‘객성에서 차와 술과 음식을 내리라는 분부가 계셨다,’고 국왕의 말을 전하며… 사신에게 차를 내는데 첫 잔은 국왕이 친히 권한다. 그러면 사신도 다시 국왕에게 차를 권하고 두 번 절을 한 후 자리
로 돌아가 차를 마신다.”12) 이처럼 국가 외교의례에 차가 사용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내치에서도 차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고려사 「예지 흉례」 편에는 11종의 의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신하들의 상이 났을 때에는 차
를 부의품(賻儀品)으로 하사한 내용이 있다. 또한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에서는 왕에게 진다(進茶)하고 참석한 대신들에게도 차를 내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는 왕이 죄인에게 참형(斬刑)을 결정하기 전에 신하들과 차를 마시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내리고자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13)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차로 뇌원차(腦原茶)가 있다. 고
려 왕실은 이 차를 진다의식뿐 아니라 죽은 신하에게 내리
는 장례용,14) 거란에 보내는 예물용,15) 80세 이상의 국로(國老)를 위한 하사용16) 등으로 폭넓게 사용하였다. 뇌원차는 일종의 용뇌향을 섞은 고형으로 된 단차(團茶)일 것
6) 三國史記 卷第十 新羅本紀 第十 「興德王」. “당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 대렴이 차의 씨앗을 가져 오니, 왕이 지리산에 심도록 하였다. 차는 선덕 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성행하였다. (入唐迴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茶自善徳王時有之 至於此盛焉)”
7)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第二 「駕洛國記」. “매 해 때마다 술과 단술을 빚고 떡⋅밥⋅차⋅과실 등 여러 맛있는 음식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어 해마다 끊이지 않게 하였다. (每歳時釀醪醴設以餅飯茶菓庻羞等奠年年不墜)”
8) 高麗史 世家 卷8 文宗32년(1078) 6월에 龍鳳茶 10근이 기록되어있고, 예종7년(1112) 송나라의 國信物인 용봉차를 諸臣들에게 하사한 기록이 있다. 또 高麗史 列傳 卷9 金仁存 조에 龍鳳茗團을 하사받은 내용이 나오며, 서긍의 高麗圖經(1124) 茶俎條에 중국의 하사된 용봉차를 귀히 여긴다는 내용이 있다.
9)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2 器皿3 茶俎條, 惟貴中國臘茶 幷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故邇來頗喜飮茶 중국의 납다와 용봉사단을 귀하게 여긴다. 하사해 준 것 이외에 상인들 역시 가져다 팔기 때문에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자못 좋아 한다.
10) 高麗史, 卷69 中冬八關會儀.11) 김미숙, 「高麗 八關會의 의례문화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12) 高麗史, 卷65 賓禮, 迎北朝使儀.13) 박미애, 「고려 전기 국가의례와 차문화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124.14) 高麗史 列傳 卷6 崔承老조 성종8년(989에) 뇌원차 2백각과 대차 10근, 崔亮조에 성종14년 (995) 뇌원차 1천각, 성종14년(995) 徐熙조에 뇌원차
2백각, 대차10근을 각각 부조한 기록이 있다.
15) 高麗史 世家 卷6 靖宗 4년에 김원충이 거란에 뇌원차를 진공한 기록이 있다.16) 高麗史 世家 卷7 文宗 80세이상 된 國老 최보성과 조옹에게 뇌원차를 각각 30각 하사 하였다.
-
4 ▪ 한국예다학 제3호(2016. 10)
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규보의 시에 처음 등장하는 유차(孺茶)17)는 “맛
이 연하고 부드러워 어린아이 젖 냄새 같고, 일만 개 잎으로 겨우 떡차 하나 만들 정도여서 한 개에 천금인들 쉽게
바꾸기 힘들다”18)고 노래하고 있다. 아마도 이 유차는 고려 토산차 중에서 지리산 운봉에서 나온 일품 단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려시대에 차가 성하였던 것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로는 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였다고 알려진 다소(茶所)19)에 대한 기록이 있다. 예컨대 다소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20)에 인근 마을에서 차를 만들어 통도사에 납공하였는데 다소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는 고다
소(古茶所)라고 전제하며 고려시대의 다소였던 마을 이름을 여러 곳 기록하고 있다. 다소가 채다⋅제다⋅유통 등의 기능을 갖춘 곳으로 본다면, 고려시대의 제다는 매우 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수록되어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지역의 고다소(古茶所)를 집계해 보면 최대 3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조선시대에는 제다를 비롯한 차문화가 상대적으로 축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내용상으로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예컨대 다시(茶詩)와 다서(茶書), 그리고 차가 생산⋅유통된 다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전기 문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1435~1493)은 유불선에도 능했지만 차를 기르고, 제다를 할 줄 알았다. 그의 시 에는 “해마다 차나무에 새 가지 자라니 그늘에 기르느라 울을 엮어 조심하네”22)라는 내용이 있어, 자연을 벗 삼아 직접 차나무를 가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시습은 제다(製茶)에도 능하여 벗 서거정(徐居正, 1420~1488)에게 차를 만들어 보냈는데, 서거정이 에서 “향과 색, 냄새와 맛이 정말 기릴 만 하고, 마음 열려 상쾌하니 신기하네”23)라고 읊고 있다. 그로 미루어 김시습이 차의 색⋅향⋅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제다까지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차가 공납되었다는 분명한 사료가
있다. 조선시대의 차는 다른 공납물처럼 국가의 세입 장부인 공안(貢案)에 기재되어 징수되었으며, 대부분 지방 관아를 단위로 관비생산(官備生産)의 원칙에 의하여 납공되었다. 관비생산의 현황은 실록 등의 기록이나 부역실총(1492) 「하동」조의 관비예납(官備例納) 기록, 세종실록지리지 「물산 편재」 항목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곳에 나타나는 차산지 35개소 중 33개소(94%)에서 차가 관비 생산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약 124개소의 중앙각사24)와 왕실의 소요자재 중 많은 부분이 군현에 분정 된 공물의 수취를 통해서
조달되었는데,25) 차도 원공물로 공납되었고, 사신에게 주는 상여품 등으로 보유분이 부족할 때에는 차산지에 별도 요
청하여 공납받기도 하였다.조선시대 공납차에 대한 사례는 함양과 거창 두 지역의
기록이 알려져 있다. 함양의 경우 김종직(1431∼1492)이 군수로 부임(재임 1471∼1475)해서 그곳 백성들이 쌀을 거두어 전라도 지역 산지로부터 쌀 1말로 겨우 차 한 홉을 사서 납공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자생하는 다종(茶種)을 구해 관비로 다원을 조성해서 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
도한 일을 들 수 있다.26) 또한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영남지방 암행어
사로 나갔을 때, 거창은 이전부터 차가 나지 않는데도 백성
17) 김명배, 茶道學論攷 I, 대광문화사, 1999, 서울, p.122재인용.18) 李奎報,東國李相國集 卷13 古律詩 黏黏入口脆且柔 有如乳臭兒與稚 摘
將萬粒成一餠 一餠千錢那易致.
19) 박종기는 “소(所)는 군현 예하의 일반 촌락 가운데 공부부담(貢賦負擔)을 위해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일반 군현의 예하 촌락과 등질적(等質的)인 것으로 중앙에 납부할 공물을 생산하기에 자연 및 사회적 조건이 합당한 곳에 입지(立地)한 전문 생산 집단으로 일반 촌락과 구별하여 관행적(慣行的)으로 소라고 호칭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보았다. (朴宗基, 「高麗部曲制의 構造와 性格-收取體系의 運營을 中心으로-, 韓國史論10輯, 서울대학교국사학과, 1984, p. 74.).
20) 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규장각 古1740~5 1冊 筆寫本).21) 이 부분에 관한 연구로는 박영식의 논문 「조선시대 茶産地와 貢納茶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15-42.)가 있으며, 그곳에 상세
한 문헌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22) 金時習, 梅月堂詩集 卷 12 年年茶樹長新技 蔭養編籬謹護持.23) 徐居正, 四佳詩集 卷之十三 第十一, 詩類, 香色臭味眞可論 開襟爽懷多奇勳. 24) 世宗實錄 21年(1439) 5月 12日 ; … 凡一百二十四司見推奴婢二十一萬數千餘口 …. 이 당시 중앙각사의 수를 124司로 표시하고 있다. 25)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財政 硏究, 집문당, 서울, 2000, pp.58-74.26) 金宗直, 佔畢齊集 卷之十. 詩集. 茶園 二首 幷叙, … 民持價買諸全羅道 率米一斗得茶一合.
-
정 순 일 / 한국 ‘제다’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 ▪ 5
들이 차 한말에 대동목(大同木) 30필을 주고 사서 납공하는 것을 보고, 해당 관사에 요청하여 진주지역의 역(役)을 거창으로 조정하고 거창의 차세를 차산지인 진주지역에 추
가하여 낼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이 있다. 그 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그의 문집에 수록된 「암행어사별단서계(嶺南暗行御史別單書啓)」(1658. 효종9)에 있다.27)
이러한 자료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 차는 공식적인 납공
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공식적인 납공품이었다면 차가 당시 조야에 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조선 후기의 제다
제다기술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서는 확인이 어렵고,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오늘날 제다의 전승과 관련해서는 조선후기 제다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조선후기 다서류를 통하여 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다서이자 약용차 제법인 부풍향다보에서 향차
만드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덕리(李德履, 1728~?)의 동다기(東茶記)(1785 전후)를 통해서도 제다를 위한 채엽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28)
떡차의 경우 조선후기 다산과 초의도 제조에 정통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금령 박영보(朴永輔, 1808~?)는 「남다병서(南茶幷序)」에서 초의의 차를 “두강처럼 둥근 차 가지고 왔네.”29)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에서 떡차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신위(申緯, 1769∼1845)는 북선원속고(北禪院續稿)에서 “서문을 지어달라고 네 개의 떡차를 보냈다. 손수 만든 것으로 보림백모(寶林白茅)라 부른다”30)고 말한다. 이것은 초의가 직접 만든 떡차에 관한 기
술이다. 추사 김정희도 초의에게 절에서 만든 작은 단차 30∼40편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31)이 나올 만큼 당시 대흥사에서도 떡차를 만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산은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에서 “곡우에는 어린 찻잎을 따서 1근을 만들고 입하에 늦차를 따서 떡차 2근을 만든다.”고 했고, 또 1830년 이대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떡차 제다법으로 세 번 찌고 세 번 말리는 삼증삼쇄(三蒸三曬)를 논하고 있다. 이규경(李圭景,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도다변증설(荼茶辨證說)」에서 다산이 불에 쬐어 말려 덩어리로 만든 작은 떡차를 만불차(萬佛茶)라 말 했다는 기록이 있다32).
다산은 떡차 제법으로 삼증삼쇄 외에 구증구포도 논하
고 있는데, 범석호의 병오서회 10수를 차운하여 송응에게 부친 이라는 시에서 “지나침을 덜려고 차는 구증구포 거치고”라는 구절에서 처음으로 구증구포를 기술하고 있다.33)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호남사종(湖南四種)」에서는 보림사의 죽전차(竹田茶)가 다산의 구증구포(九蒸九曝)를 통해 만들어졌고,34) 이것이 중국의 차에 밑돌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원도 가고오략(嘉梧梧略)의 시를 통해 다산과 보림사 떡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헌상으로는 18세기 이운해(李運海, 1710~?)의 부풍향다보(扶風鄕茶譜)를 통해 부안 지역의 떡차와 향차의 전승에 대하여 알 수 있고, 19세기 초의(草衣意恂: 1786~ 1866)의 다신전(茶神傳)에서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잎차 제조법인 덖음차의 제법35)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
27) 閔鼎重, 老峯先生文集 卷之十一, 附錄 上, 嶺南暗行御史別單書啓(1658. 효종9년, 戊戌二月 二十八日受命. 五月初六日復命) 居昌等邑有上納雀舌 而元非土產。故貿易之際 一斗之價 多至大同木三十疋 民不能支堪 請令該司更以居昌等邑所納雀舌之數 加定於晉州等產出之邑 改以晉州等邑他役 移定於居昌等邑 係是民瘼不可不變通.
28) 李德履, 東茶記 “차에는 우전(雨前)과 우후(雨後)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전이란 작설(雀舌)을 가리키며, 우후는 즉 명(茗)과 설(蔎)이다. 차라는 식물은 일찍이 싹을 맺어 늦게야 싹을 틔운다. 고로 곡우 때에는 찻잎이 미처 자라지 못하였으니, 모름지기 소만(小滿)이나 망종(芒種)이 되어야 비로소 크게 싹을 틔우게 된다. 납일(臘日) 이후부터 곡우 이전까지 성하여, 곡우 이후부터 망종까지는 모두 딸 수 있다. (茶有雨前雨後之名. 雨前者雀舌是已, 雨後者卽茗蔎也. 茶之爲物, 早芽而晩茁. 故穀雨時茶葉未長, 須至小滿芒種方能茁大. 盎自臘後至雨前, 自雨後至芒種皆可採取.)”
29) 朴永輔, 「南茶幷序」, 頭綱美製玉團圜.30) 申緯, 北禪院續稿, 乞序文於余而遺以四茶餠 卽其手製 所爲寶林白茅也.31) 金正喜, 「與草衣」 32, 阮堂全集 人, 寺中所造 小團三四十片 稍揀其佳 惠及切企.3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荼茶辨證說」 “교남 강진현에 만불사(萬佛寺)가 있어 차가 나는데, 정다산이 귀양할 때 (찻잎을) 찌고 배화하여 덩어
리(차)로 만드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작은 떡(차)와 같이 만들어, 만불차(萬佛茶)라 이름하였을 뿐이다. (嶠南康津縣, 有萬佛寺出茶, 丁茶山鏞謫居時, 敎以蒸焙爲團, 作小餠子, 名‘萬佛茶’而已.)”
33)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서울, 2011, p.128.34) 李裕元, 林下筆記 「湖南四種」 “강진 보림사에 죽전차가 있다. 정열수(丁洌水, 정약용)가 이 찻잎을 얻어 절의 승려에게 가공법인 구증구포법을 가
르쳐주었다. (康津普林寺竹田茶, 丁洌水若鏞得之. 敎寺僧以九蒸九曝之法)”
35) 草衣, 茶神傳 「造茶」 “한 근 반의 차를 넣어 덖고, 솥이 극히 뜨거운 때 비로소 찻잎을 넣고 급히 덖으며, 불의 온도가 낮아서는 안 된다. 將茶一斤半焙之, 候鍋極熱, 始下茶急炒, 火不可緩”.
-
6 ▪ 한국예다학 제3호(2016. 10)
점기에는 조선의 차와 선을 통해 ‘백운옥판차(白雲玉版茶)’라는 상표가 있는 녹차36)가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흥을 중심으로 한 전남 해안 지역의 엽전모양 고형차인
돈차(錢茶) 생산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흥사, 보림사 등 주요 사찰과 강진, 장흥, 하동 등지에서 아직도 수제 덖음차와 돈차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볼 때 제다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도록 그 전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를 만드는 일은 유형⋅무형의 문화재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적 제다
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차가 그에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
에게 공급되고 있다. 즉 제다는 오랜 우리의 문화요 삶의 일부였던 것이다.
2. 우리나라 제다의 고유한 특성
차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 사용되다가 삼국시대에 전
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차는 지역 혹은 제조방법에 따라 중국과 차별성이 인정되며 음용방법
에도 차이가 있었다. 최치원이 찬술한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眞鑑
禪師大空塔碑」에 보면 “다시 한명(漢茗)으로 공양 삼는 이가 있은 즉 돌솥에 섶 불을 지펴 가루를 내지 않은 채로
끓이며 말하기를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한다. 배를 적실뿐이다.’하였다.”37)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진감선사 혜소(774~850)는 차를 즐겨하였지만 중국과는 다른 음다 방식으로 차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병차를 가루 내어 끓여 마시는 것이 주류였는데, 가루내지 않고 끓이는 방식은 중국의 음다법과는 다른 갈래이다. 이로서, 당시 우리 나름의 제다기술과 음다 풍속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자료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까지도 전남 해안 지역에서 돈차 생
산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가루내지 않고 고형돈차를 끓여 마시는 음다 양상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산지로 강진⋅보성⋅순천⋅장흥⋅하동 등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고유성을 지닌 차를 생산해내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중에는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자기 생산지와 관련 깊은 강진⋅장흥이 있다. 차를 마시는 음다 도구가 제다의 변천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발전해왔음을 상기할 때, 다기의 생산과 유통은 제다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조선시대에는 동의보감(東醫寶鑑)38), 부풍향다보39) 등을 통해 약재를 가미한 약성차를 발견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장흥 지역의 돈차라 불리는 떡차와 이후 하동지역
의 발효차인 잭살이 감기로 열이 나면 끓여 마시는 상비약
으로 활용되었던 점에 주목할 때, 차는 민간의 의약이며 친근한 벗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래 발견된 전남 해안 일대의 떡차류
는 약재를 가미하지 않았지만 약용처럼 상비약으로 준비되
었고, 장흥지역의 돈차는 당대(唐代) 육우(陸羽, 733~804) 이래 사라진 고형차 제법이 우리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전
승된 것으로 알려져 동아시아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우리 나름의 제다 방식이 존재
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약용으로 때로는 기호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제다는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와 민간적 차원을 막론하고 재정⋅문화⋅약용의 재산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다의 기술은 찻잎이라는 동일재료를 사용하지만 고형으로 된 떡차와
잎차를 생산하는 외에 약재 등의 재료가 가감된 향약차 등
그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해 왔다. 시대별 여건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가 변곡선을 이루
어 오기는 하였으나 제다와 음다 문화는 지속적으로 전승
되며 우리나라 역사와 백성들의 삶의 일부를 이루고 오늘
36) 諸岡存⋅家入一雄 共著, 朝鮮の茶と禪 , 日本の茶道社, 東京, 1940, p.130. 37) 「眞鑑禪師大空塔碑」, 復有以漢茗爲供者 則以薪㸑石釜 不爲屑而煮之曰 吾不識是何味 濡服而已.38) 東醫寶鑑에서는 ‘茶’ 이외 細茶, 臘茶, 苦茶, 芽茶(茶芽), 雀舌茶, 好茶, 春茶, 建茶, 乾茶, 茗, 老茶(老茶葉)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의 차들이
등장하며, 크게 어린잎의 차와 늙은 잎의 차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어린잎의 차의 경우 대개 단방 또는 약재의 구성약재로 사용되었으며, 늙은 잎의 차의 경우 강한 고미(苦味)가 필요한 처방이나 외용으로 사용되었다.
39) 黃胤錫, 頤齋亂藁 1冊 「扶風鄕茶譜」 茶名 “풍을 맞은 때: 감국*, 창이자 (風 : 甘菊*, 蒼耳子) 추울 때: 계피*, 회향 (寒 : 桂皮*, 茴香) 더울 때: 백단향, 오매* (署 : 白檀香, 烏梅*) 열이 날 때: 황련*, 용뇌 (熱 : 黃連*, 龍腦) 감기 들었을 때: 향유*, 곽향 (感 : 香薷*, 藿香) 기침할 때: 상백피, 귤피* (嗽 : 桑白皮, 橘皮*) 체했을 때: 자단향, 산사육* (滯 : 紫檀香, 山査肉*) 표점(*)을 찍은 글자를 취하여 ‘칠향차’로 삼으니 각자 주된 치유가 있다. (取点字爲七香茶, 各有主治)”
-
정 순 일 / 한국 ‘제다’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 ▪ 7
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즉 우리나라의 제다는 오랜 역사를 이루어 왔으며 그 음용 방법을 따라 제다양식도 독특한
형식을 이루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Ⅲ. 제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
1. 제다와 미학적 기준
문화재청은 제다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전제로
서 예술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예술성의 하위 가치로서 고유성과 형식미⋅내용미⋅표현미 등을 요청하였다.40)
그것은 아마도 한국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무형문화재 제도가 실시되던 이래의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당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은 ‘한국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연극⋅음악⋅무용⋅미술⋅공예⋅민속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특히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것’을 문화재보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41) 이러한 무형문화재 제도는 큰 틀에서 별다른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는데, 문제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연극⋅음악⋅무용⋅미술⋅공예⋅민속’ 등으로 한정한 것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들 종목은 무형문화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무형문화의 전부는 아니었다. 이 때의 ‘무형’이라는 의미는 ‘유형’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무형의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42)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재’ 종목에는 정작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들이 상당부분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으로도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개념 자체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유네스코
표준에도 영향을 미쳤다.43)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무형문화 혹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역시 미적
혹은 예술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
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새롭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예술성은 뛰어나지 않으나 미래적 활용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들도 있을 것이
며, 예술성이 부족하지만 그야말로 인류의 삶의 궤적을 잘 드러내는 그런 무형문화유산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44)
제다의 경우 그러한 관성을 벗어나는 좋은 본보기가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제다를 무형문화재로 지
정할 때의 요청사항에 형식미와 내용미 등 아름다움의 평
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이면서도 넘
어설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에 맞추어 제다의 아름다움을 도출해 내야했던 당사자로서45) 당혹감과 함께 제다에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찾는 기쁨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
을 수 없다.
2. 제다의 형식미와 내용미
1) 찻잎의 형식미
찻잎이 주재료가 되는 제다는, 잎을 찌거나 덖어서 찻잎 형태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는 잎차와, 잎을 쪄서 틀에 넣어 고형 상태로 만드는 떡차로 크게 나뉘는데 이에 관한 기본
적인 형식미를 살펴보자.찻잎은 제다할 때 불을 받는 위치와 제다과정에 따라 다
양한 형태와 곡선의 형식미를 띠게 된다. 제다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찻잎이 생산되는데, 특히 덖음차의 경우 손길이 가고 말리는 방식에 따라 형태는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제다과정에서 보이는 찻잎은 무정형(無定形)의 형식이라 해도 좋을 만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형태를 상정하여 상징적 의미를 도출해 보자. 제다의 형식미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찻잎 가운데 일자형의 찻잎은 단선(單線)의 형식미(美)로 볼 수 있다. 단선은 하늘과 인간을 잇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상징적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일자형의 모습은 중국적 전통에서 경(經)으로 상징된다. 경은 날 즉 세로
40) 2015년 5월에 문화재청에서 발주된 「‘제다(製茶)’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연구용역」에 지정된 항목이다. 41)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2008, pp.178-187.42) 김재호, 「무형문화 유산으로서 전통농업지식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 민속학연구 제 24호, 2009, p.31.43) 그리고 이러한 개념 설정은 국내에서만 사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까지 통용되었는데, 주지하듯이 ‘무형 문화유산(intangible heritage)’이라는 용
어가 유네스코를 통해 1990년대 후반 국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 역시 예술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부터 무형문화재제도를 실시한 한국이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인데, 그 결과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에 선정된 것들 역시 한 결 같이 한국의 무형문화재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김재호 같은 논문, p.31.)
44) 예컨대 전통농업지식이나 김치문화 등을 들 수 있다.
45) 본 연구자를 비롯한 원광대학교 예다학연구소 팀은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제다(製茶)’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연구를 진행⋅보고한 바가 있다.
-
8 ▪ 한국예다학 제3호(2016. 10)
를 의미한다. 예컨대 베 짜는 것을 보면 경은 날줄에 해당한다. 이는 하늘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종교적인 의미로 거듭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동양의 전통에서는 하늘의 말씀을 인간에 전하는 책을 경전(經典)이라 부르는 것이다.46) 동양인은 전통적으로 천인합일을 주요 이념으로 삼아왔지만 특히 한국인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중시되었다. 제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차를 만드는 일을 매우 신성시
하였다. 차를 성스러운 사물로 여겼으며, 차를 만들 때는 목욕재계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삼갔으며 경건함을 생명처
럼 여겨왔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성스러운 전통은 제다의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다. 제다할 때 화장품을 쓰지 않는 것도 그들의 전통이다. 교단적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태도와 삶의 방식은 하늘을 섬기며 천인합일을 목표하는 제
의(祭儀)와 닮았다. 제다인들이 차를 만들 때 하늘에 닿는 정성으로 임하고,
그것이 차로 나타나며, 그 때 차가 형상하는 일자형은 하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으로 상징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다인에게 차는 경(經)이다. 차가 나타내는 일자형은 그러한 정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선(單線)의 미(美)로 간주할 만하다.
곡선형의 찻잎은 태극의 곡선이 지니는 형식미를 연상
케 한다. 태극에 관한 문헌적 기록은 주역의 「괘사전」에서 “역에는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 이 태극은 송대 주돈이(周敦頤, 1071~1073)에 의해 「태극도설」이 나온 후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무극(無極)은 궁극적 존재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태극(太極)과 같다는 것이다. 이 태극의 차원에서 음양의 교차가 생생(生生)하고 불식(不息)하는 것에 의하여 만물이 형성된다는 것이 신유가(新儒家)의 세계관이다.
무극은 흔히 원(圓)의 형태로 상징되며 태극은 형태적으로 고운 곡선으로 표현된다. 한국인은 생활의 많은 곳에서 곱고 아름다운 곡선을 수용하고 있다. 한복의 소매선과 한옥 처마의 날렵함 그리고 고려자기와 백자의 곡선이 그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의 형태는 같은 동양 3국 가운데에서도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라는 면에서 돋보이는
형식미라 평가할 수 있다.
곡선의 미학은 제다할 때 나타나는 찻잎의 곡선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찻잎이라는 자연에 제다공의 정성과 기술에 따라 각종 곡선의 형태미가 산출되는 것
이다. 그런데 직선과 곡선 이외에 찻잎이 띠는 여러 가지 형태
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형태가 없는 무정형(無定型)의 형식미라 하겠다. 제다 과정에서 찻잎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무형식의 형식, 무정형의 조화라 할 만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각기 자유스러우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의 조화로
움을 보이는 아름다움이라 할 만하다.47)
잎차의 제다과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형태의 곡선미를
무의도적 형식미로 규정할 수 있다면, 떡차의 경우는 의도적 형식미에 가깝다. 떡차는 일반적으로 원형의 틀을 이용하여 둥근 엽전의 형태로 찍어내는데, 그 중간에 구멍을 낼 때는 반드시 원형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때로는 사각형을
만들기도 한다. 이점 또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심성에 부합한다.
기하학적인 원의 형태가 아닌 자연스러운 구멍을 유지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자연과 무위를 선호하는 형태미를 추구하는 심성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8) 그러나 그 떡차의 형태를 철학적으로 분석한다면 그것
은 심원한 사상적 기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天圓地方)’ 라는 동양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천원지방의 형태를 작은 떡차 하나에서도 나타내려 한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다. 이는 작고 하찮은 사물에서도 하늘의 이치를 구현하려 한 하나의 증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한 의도를 미리 품고서 제다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무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그러한 형식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민족성은 무의식적 동작이나 일상용품의 제작에도 나타
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조선의 도공들이 빚은 다기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발견하지만 정작 당시의 도공
들에게는 그러한 유위적(有爲的) 의도가 있을 리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49)
46) 한편 불교의 경우에도 경은 싼스끄리뜨어 Sūtra를 번역할 때도 쓰이는데 그것은 ‘실(絲)’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Sūtra와 중국의 經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천인합일이라는 의미에서 일치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47) 이러한 경지는 불교의 화엄교학에서 말하는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의 경지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 각자의 모습과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각 사물은 서로 통하며,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궁극적 미라고 할 만하다.
48)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돈의 모습을 상징화하여 행운을 기원한다는 재미난 해학미도 곁들여 있는 것 같다.
-
정 순 일 / 한국 ‘제다’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 ▪ 9
제다에도 그러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작은 떡차 하나에도 하늘과 땅의 이치를 함유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주적 아름다움과 인륜의 지향점을 동시에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떡차의 형식미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조상은 제다의 작업 그 자체를 하나의 노동이나 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천인합일을 지향하는 거룩한 제의(祭儀)의 내용미를 함의한 것으로 승화시켜왔던 것이다.
2) 제다과정의 표현미
떡차는 대부분 틀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만들며, 지역에 따라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대꽂이에 끼워 넣는데, 엽전을 꿰어놓은 듯한 모습에서 정률적(正律的) 표현미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다의 제작 공정 중에 나타난 동적
움직임에서 일종의 표현미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 제다에서의 유념은 우선 형태적으로는 원형미(圓形美)를, 동작으로는 순환미(循環美)를 연출한다. 그리하여 ‘유념’과 ‘덖음’에서 우리는 동(動)과 정(靜)의 순환적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제다과정에서 이러한 동적 표현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그 밖에 손 혹은 차 주걱 따위의 운용에서도 아름다
움을 간취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미와 순환미는 제다의 솥에서도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제다할 때 차를 덖는 솥은 둥근 형태를 띠고 있
다. 이 둥근 차 솥에 찻잎을 넣고 가열하면서 덖는 양태에서 우리는 동양적 양의(兩儀)의 조화미를 발견하게 된다. 제다할 때, 찻잎을 덖는 좌우상하의 교차하는 움직임은 음과 양, 그리고 그것이 배합된 태극의 형상을 좌우상하로 그리는 형국이며, 이는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의 변형과정과 복귀과정을 연상케 하는 형이상학적 아름다움의 세계를
연다.50) 또한 제다는 불과 어우러진 예술이다. 불의 조절을 통하
여 천변만화의 다양한 제다가 가능하다. 뜨거운 불의 양(陽)과 차가운 공기의 음(陰)이 적절히 조화된 상태에서, 찻잎을 뜨겁게 혹은 차갑게 교대하여 다루는 과정을 통해
서, 우리는 동양적 순환미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뜨거
움과 차가움은 우주적 기후변화로부터 인간의 체질에 이르
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적용되었던 것이 동양적 세계
관이었다.51) 유념은 찻잎을 누르고 비비고 하면서 차의 용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인데, 주로 멍석⋅면포⋅대바구니 등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유념의 표현미 가운데 압권은 숙련된 제다인의 손놀림 그 자체이다. 제다인의 손이 찻잎을 둥글게 모아 힘써 누르는가 하면 가볍게 돌릴 때, 여기에는 제다인의 외유내강(外柔內剛)의 기술이 담겨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제다인은 익숙하에 비비고 털어내면서 순환적
표현미를 극대화한다.이러한 일련의 제다과정은 무극과 태극을 만물 생성의
기초로 상정하고 태극의 동정으로 음양이 나타나며, 음양은 오행으로 나뉘며 이 오행의 운동을 통해 자연변화가 생성
되고, 음양변화에 의한 만물의 생성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동양적 존재론52)을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Ⅳ. 제다의 학문적⋅지역적⋅미래적 과제1. 제다학의 체계화
차는 전통적으로 기능성을 지닌 음료로서도 각광을 받
아왔다. 차는 약용, 식용, 음용의 순으로 발달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약용과 음용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차는 영양기능⋅감각기능⋅생체조절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치유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제다된 차의 기능성은
높이 평가된다. 차에 대한 제반 분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다가 학문
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체계적인 학문적 축적을 통하여 제다와 제다 전승자, 그리고 제다 기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분석이 필요하다. 제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발굴되지 못했던 전통 음식제조분야이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전승과 보존은 음식제조분야와 시너지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약용으로서 차의 기능적 활용을
49) 柳宗悅 「禪茶錄を讀んで」 柳宗悅全集著作篇 第17卷. 筑摩書房, 東京, 1982, pp.341-358.50) 周敦頤, 「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陽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51) 한의학에서는 그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사람의 기질을 구분하는 기준을 삼기도 하였다. 이제마(東武 李濟馬, 1837~1900)의 사상의학은 그러한 것의 응용
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명저 東醫壽世保元에서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므로 같은 병이라도 그 치료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太陽⋅小陽⋅太陰⋅小陰의 네 가지 체질이 있다고 하는 사상의학을 제창하였다. 비록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지만 그것은 뜨거움과 차가움의 대비를 네 가지로 세분한 것이다.
52) 周敦頤, 「太極圖說」, ‘一動一靜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二氣交感 化生萬物 而變化無窮焉’.
-
10 ▪ 한국예다학 제3호(2016. 10)
살펴보면, 추울 때 계피나 회향, 더울 때는 백단향과 오매, 기침할 때 상백피나 귤피 등 증상에 따라 해당 향초를 가감
하여 향차로 사용하는 용례 등도 나타나고 있다. 약용 혹은 음용으로 사용되었던 차는 그 용도에 따라 예물용⋅연회용⋅헌다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정의 하사품 혹은 국가 간의 국
신물(國信物) 또는 불교 의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향초를 가미하지 않은 일반 차가 가벼운 감기나 소
화불량 등의 질환에 대비한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기도 함
으로써 차는 음용과 약용의 활용도를 겸하여 가치가 돋보
이는 음료였다. 특히 음용차 중에서 돈차는 편리성과 함께 지역 기후에 적합하도록 꿰어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의 기능에 관련하여 건강과 관계된 제반 학문
의 참여가 요청된다. 차는 제다를 중심으로 생각할 경우, 재배학이나 식품가공학 등의 영역과도 관련이 있으며, 차의 기능성 연구는 이화학적 접근이 요청된다. 오늘날 차의 성분이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이며, 나아가 건강식품이나 약품 등과의 복합조제방향도 무한한 가능성의 분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는 건축⋅철학⋅예술 등의 여러 분야가
연관된다. 그밖에 차는 사회⋅심리학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구의 소재가 될 수 있어서 그 활용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에 걸쳐있다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분 관련의 이
화학적 분야나 음다 문화와 연관된 인문학적 분야가 관심
의 대상이 되어 온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제다의 영역까지 포괄한 차에 관한 총체적인 역사와 제다기술에 대한 연구
가 촉진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차별화된 한국적 제다기술
과 차 문화 형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광의의 차문화는 정신문화⋅행위문화⋅제도문화⋅물질
문화 등을 포괄하는데, 제다분야는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면서 너른 의미의 차문화와 연결 혹은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차에 관한 모든 영역과 응용분야가 제다를 기반으로 하
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모든 것의 핵심으로서
제다의 중요성은 심대하다. 만약 제다에 특별한 학문적 성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수반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로
의 파급력은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융⋅복합 및 산학협동 연구에 있어서도 차와 차를
둘러싼 모든 학문과 산업은 유기적 관련성이 증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리고 차는 세계 3대 기호 식품으로서 시장성도 크므로, 전통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제다 기술이나 도구의 개발은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제다와 관련된 제반 도구와 기술이 유형⋅무형문화재로서 전승된다면 제다 기술에 사용되는 제다용 도구
의 문화재적⋅민속학적 가치도 높아지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
해 제다방법과 제다 전승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기록물
들을 아카이브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유관 학문의 연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제다의 지역적 특성화
제다 지역은 차나무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로
한반도 남단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제다는 차나무의 군락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찻잎을 수확한 후 원거리 이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차나무가 자생 내지는 재배 가능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제
다가 성행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이들 지역은 나름의 제다와 음다,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차문화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며 전승되어 오고 있다. 전남 순천을 중심으로 한 작설차, 전남 해남 대흥사의 다풍을 잇고 있는 덖음녹차, 전남 해안지역 특히 장흥을 중심으로 한 돈차 그리고 경남 하동을 중심으로 한 덖음차와 잭살이
라 불리는 발효차 등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제다라고 할 수
있다.조선시대 이래 관련 문헌을 통해 보면 제다가 지역 및
사찰등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동과 순천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동의 경우, 삼국사기 「흥덕왕(興德王)」조의 내용을 통해 지리산 일대 차 생산이 확인되고,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비롯한 지리지를 통해서도 토산차의 기록이 확인된다. 특히 조선후기 차에 조예가 깊었던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쌍계사 육조탑의 만허(晩虛)가 만든 차 맛에 감동하여 라는 시에서 “차 마시는 일 학문하는 일 겸했으니, 금탑 빛을 흠뻑 받은 차 마시라 권하네”53)라 하고, 에서는 “쌍계사 봄빛에 오랜 차 인연, 제일의 두강차 육조탑 아래 빛나네”54)라고 만허의 차에 답례하
53) 金正喜, 阮堂全集 卷10 茶事更兼參學事 勸人人喫塔光圓.
-
정 순 일 / 한국 ‘제다’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 ▪ 11
는 시를 짓고 있다. 연행을 통해 청나라의 좋은 차를 접할 기회가 있었던 추사가 찬사를 할 정도로 당시 하동의 제다
법이 상당한 경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순천의 경우, 차의 생산기록은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
승람⋅고사촬요 등을 비롯한 다수의 지리지에 나오고, 허균(許筠, 1569~1618)의 성소복부고(惺所覆瓿稿) 에도 “작설차는 순천산이 제일 좋고 다음이 변산이다.”55)라는 기록 등이 있으며, 선암사 내에는 칠전선원(七殿禪院) 차밭이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 남부지역은 차뿐 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음악⋅미술⋅음식 등 제반 유형⋅무형 문화가 잘 형성된 지역이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성과 문화에 걸 맞는 차문화를 진흥시
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각 지역에 따라 차문화의 융
성을 꾀하는 노력이 눈에 띈다. 예컨대 장흥 지역의 돈차는 ‘청태전’이라는 이름으로 장흥군이 주도적으로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김해의 장군차도 그 전승 빈도와 이행범위가 넓어지는 사례를 보인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사찰의 고유한 다풍(茶風)이 스토리텔링을 입고 조화를 이루며, 지자체와 국가가 제다 및 차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한국의 차산업은 그동안 서구의 커피와 중국차, 일본차
에 가려 그 행방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을 헤
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차와 일본차에 식상한 서구인들이 한국차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한국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차산업의 부흥을 위한 한국적 제
다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차와 지역문화 혹은 지역경제와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
요도 없이 크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하여 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지향함으로써 제다에 대한 국가와 지자
체 그리고 차인들의 관심과 배려가 증대하고 새로운 차원
의 차문화와 산업이 요청되고 있다.
3. 제다의 미래적 과제
늘 수고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제다인들에게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56) 첫째, 우리나라 제다의 원형을 찾고 분류⋅보존하는 일
이다. 현재 제다의 빈도와 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나 그 원형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보호⋅전승이 시급하다. 우리가 찾아야 할 제다의 원형은 단수가 아닌 복수이다. 그리고 전통 제다법을 익힌 우수한 제다 장인의 노령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수자⋅이수자 등의 폭넓은 후계양성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수 혹은 일부에 행해지는 제다방법이라 할지라도 보
존 유지하려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면밀한 현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다
는 천의 얼굴을 지닌 연금술이다. 제다공정의 순서만 바꾸거나 시간만 조정해도, 그리고 유념의 방식만 조금 달리하거나 발효조건에 변화를 주어도 전혀 다른 맛의 차가 제조
될 수 있다. 실제로 하동지역의 잭살차의 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집집마다 사람마다 제다방식이 차이가 있으며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많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널리 문화콘
텐츠로 활용되도록 하며 창조적 제다기법의 영감을 제공하
기 위한 아카이브화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와 무형유산 온라인 전수조사’와 같은 사업에 제다의 영역을 포함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과 현상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57) 그리하여 대상 중심성을 탈피한 맥락 중심의 기록화 기반을 마
련하고 무형유산의 시민 향유 가치를 높이며 미래 연구자
와 교육 수요에도 맞는 연구와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제다의 전승주체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
원이 필요하다. 전통 제다법을 익힌 우수한 제다 장인의 노령화로 인하
여 전통 제다법의 실전(失傳)이 우려되는 시기에 전통 제다법의 확보와 보호차원에서도 전수자⋅이수자 등의 후진양성방안이 매우 시급하다.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소관부처
54) 같은 책, 卷10 雙鷄春色茗緣長 第一頭綱古塔光.
55) 류건집, 한국차문화사 上, 이른 아침, 서울, 2007, p.493.56) 문화재청은 2012년 5월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설립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어서 제다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고무적이
다.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전승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멀티 Complex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설립 및 운영. ◆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57) 정형호, 「ICHPEDIA(무형문화유산 백과사전)」, 무형문화유산(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 2012), p. 43.
-
12 ▪ 한국예다학 제3호(2016. 10)
에서는 이들 전승주체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지원방식을
선정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 일 년의 한 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제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다인 전반에 포괄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진흥방법도 연구할 사항이다. 일본은 1960년대 제다 기술에 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지역별 제다 기술을 보존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구체적으로 육대 다류로 분류하고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대표성
전승인을 두어 제다 전승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연구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원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전승과정이 더욱 중요하
고 전승체계를 바로 세워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
게 유지 보전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전
승체계의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무형문화
유산교육은 공동체와 집단의 무형문화 유산의 전승과 재창
조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교육이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진흥의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58)
무형문화재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유
산들은 그것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59) 그에 비하면 전통생업지식은 그런 보존과 관련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했음에
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많은 삶들을 지
지하고 있다.비록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다거나 계량화하
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술적 가치보다 지속가
능한 미래의 대안 문화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제다를 비롯한 전통생업지식들은 기존의 등재 무형문화
유산들보다 그 중요도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등재 무형문화유산들의 보존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이상의 정책
적 배려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제다를 비롯한 차문화 전반은 문화정책상에서 중
시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문화적 표현 자체보다 무형문
화유산을 통해 세대 간에 전해지는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
에 있다. 그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소수집단이나 주류집단 모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
라 한 나라의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하다.60) 특히 차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들의 삶에 힐링과
인성의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인성교육이 갈수록 강조되는 오늘날에, 제다문화는 무형문화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앞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문화의 가치(Value)를 곧잘 가격(Price)으로 환원시켜 생각하는 까닭에 무형문화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의 경우 가치가 문제가 될 뿐 가격이 문제되지 않는다. 부모를 섬기는 문화나 일생의례와 같은 무형문화는 인간답게 사는 데 반드시 필
요한 가치이지만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독점할 수도 없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61)
제다는 무형문화재로 제정되었지만 그에 수반하는 포괄
적인 차문화는 미래세대에 인성과 힐링의 소재로써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다와 그에 따른 차문화는 문화정책상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넷째, 소멸위기에 있는 전통 제다장비를 제다 기술과는 별도로 유형문화재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제다는 무형인 동시에 유형의 문화이다. 제다 기술을 보유한 전승자만이 아니라 효율성과 기계화에 밀려 소멸위기
에 있는 전통 제다장비의 보호도 필요하다. 사실 제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만, 무형문화와 유형문화 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
며, 무형문화에 의해 유형적인 물질문화가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62) 제다방식과 제다장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닌 동전의 양 면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제다장비를 조사하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다.
다섯째, 무형문화재인 제다는 다른 문화 분야와 유기적인 협조 혹은 시너지를 형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야 한다.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민담 등을 포함한 설화는 무형문화
재인 제다가 입어야 할 스토리텔링의 보고(寶庫)이다. 이들
58) 위의 논문, p.210.
59) 예컨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종묘 제례 및 제례악의 경우, 매년 1회 행하는 공개 행사비용만 하더라도 2000년도에 총 행사비용이 1억 8천 5백만 원이었다. 이 밖에 기능 보유자, 보조자, 전수생,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보존회 관리비 등을 고려한다면 실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그 보존에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60) 최종호,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방안-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3호, p.201.61) 임재해, 「무형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한국민속학자대회 기조발표, 2008.10.30. p.10.62) 임재해, 「물질문화의 재인식과 문물로서 유무형 문화의 유기적 해석」 민속학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7, p.175.
-
정 순 일 / 한국 ‘제다’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 ▪ 13
옷을 입은 제다는 첨단 장비의 힘을 빌고 게임⋅애니메이션⋅의상⋅건축 등 여러 분야와 시너지효과를 내며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창조적 전개를 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제다를 비롯한 차문화의 확산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차가 사람들의 일상문화로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때에 차의 산업화와 차의 부가가치는
덩달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역마다 가문마다 다른 제다형태를 조사하고
지원하며 특성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것을 개별⋅단체⋅지역적 무형문화재를 특색에 맞는 형태로 지원책을 만들
필요도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은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의 차원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이 현실화되도록 무형문화
재 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법령을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다가 지역별 특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Ⅴ. 맺음말
제다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도록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시대별 여건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가 교차되기는 하였으나 제다와 음다 문화는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부를 이루어
왔다. 그것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커다란 가치와 의미가 있다.
제다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여왔고,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제다의 과정 혹은 그 결과에서 우리는 내재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제다법과 사용 도구에 따라 차의 외재화 된 아름다움을 형식미
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다시 동양의 존재론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미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제다를 통하여 실현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다는 충분히 아름답다. 제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더욱 정비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체계화된 학문적 정리와 축적을 통하여 제다와 제다 전승자, 그리고 제다 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비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와 보존을 통해 제다는 여러 분야와 조화를 이루며 시
너지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다 지역은 차나무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로 한반도 남단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제다⋅음다⋅음식⋅예술,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여러 문화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해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서구에서 한국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
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한국차산업의 부흥을 위한 제다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됨을 계기로 하여 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면 차문화가 지니는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도 확고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국가무형문화로서의 제다는 미래
진행형이다. 무형문화의 생명력과 창조력은 물과 같다. 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씻어주며 아래로 흐르다가 막히
면 돌아간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처음 본 물그릇을 원형이라고 규정한 뒤에 물을 항상 같은 물그릇에만 담도록 하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원형 계승론이 지닌 모순이 될 수 있
다.63) 그러므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무형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무형문화의 생명력은 창조력에 있기 때문이다.
제다는 종목지정이며 개인 혹은 단체지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방향을 여는 방향으로 제다라는 무형문화유
산을 살려 나가는 것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제다라는 게 순서와 시간, 그리고 사소한 손놀림 하나에도 그 색과 맛이 천변만화하는 신비의 연금술이 아닌가.
과거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과 미래의 문화적 창
조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며 둘이라는 사실(二而一 一而二)임을 상기한다면 우리의 제다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미래진행형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1. 高麗史2. 茶經3. 東醫寶鑑4. 三國史記5. 三國遺事6. 頤齋亂藁7. 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8. 金時習, 梅月堂詩集9. 金正喜, 阮堂全集10. 金宗直, 佔畢齊集
63) 임재해, 앞의 논문, p. 23.
-
14 ▪ 한국예다학 제3호(2016. 10)
11. 閔鼎重, 老峯先生文集12. 朴永輔, 「南茶幷序」13.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14. 徐居正, 四佳詩集15. 申緯, 北禪院續稿1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1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18. 李德履, 東茶記19. 李裕元, 林下筆記2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21. 周敦頤, 「太極圖說」22. 草衣, 茶神傳23. 김명배, 茶道學論攷 I, 대광문화사, 서울, 1999.24. 류건집, 한국차문화사 上, 이른 아침, 서울, 2007. 25.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 硏究, 집문당, 서울, 2000.28.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서울, 2011. 29. 靑木正兒, 靑木正兒全集 第8卷, 春秋社, 東京, 1971. 30. 諸岡存⋅家入一雄 共著, 朝鮮の茶と禪 , 日本の茶
道社, 東京, 1940.31. 김미숙, 「高麗 八關會의 의례문화연구」, 원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3.32. 김재호, 「무형문화 유산으로서 전통농업지식의 가치와 보존
의 필요성」 민속학연구 24호, 2009.
33. 무산, 한국 역대고승들의 다시, 도서출판 명상, 서울, 2000.34. 박미애, 「고려 전기 국가의례와 차문화연구」, 원광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5.35. 박영식, 「조선시대 茶産地와 貢納茶에 관한 연구」, 원광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36. 박종기, 「高麗部曲制의 構造와 性格-收取體系의 運營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10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37. 柳宗悅 「禪茶錄を讀んで」 柳宗悅全集著作篇 17
卷. 筑摩書房, 東京, 1982.38. 임재해, 「물질문화의 재인식과 문물로서 유무형 문화의 유기
적 해석」 민속학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7.39. , 「무형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한국민
속학자대회 기조발표, 2008.40.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서울, 2008.41. 정형호, 「ICHPEDIA(무형문화유산 백과사전)」 무형문화유
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 2012.42. 최종호,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
과 공존방안-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3호, 2016.
투 고 일 2016. 09. 15
수 정 일 2016. 09. 30
게 재 일 2016. 10. 05